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 예술 작품을 만들고, 논문을 작성하며, 심지어 코드를 생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창작자’와 ‘저작권’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법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 셀카 사건‘입니다.
 2011년,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세계적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마리의 마카크 원숭이였습니다.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자신의 셀카를 찍은 이 원숭이의 사진은 곧 저작권 논쟁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2011년,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세계적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마리의 마카크 원숭이였습니다.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자신의 셀카를 찍은 이 원숭이의 사진은 곧 저작권 논쟁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 사진이 원숭이에 의해 찍혔으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료로 공개했고, 이에 슬레이터는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심지어 동물권 단체 PETA는 원숭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 법정에서 다뤄졌고, 2018년 항소심에서 법원은 “동물은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인간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I 개발자? AI를 사용한 사람? 아니면 AI 자체?
원숭이 셀카 사건의 판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AI 역시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AI의 창작물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이 과연 적절할까요?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창작’과 ‘저작자’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AI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숭이 셀카 사건은 우리에게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저작권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가, 윤리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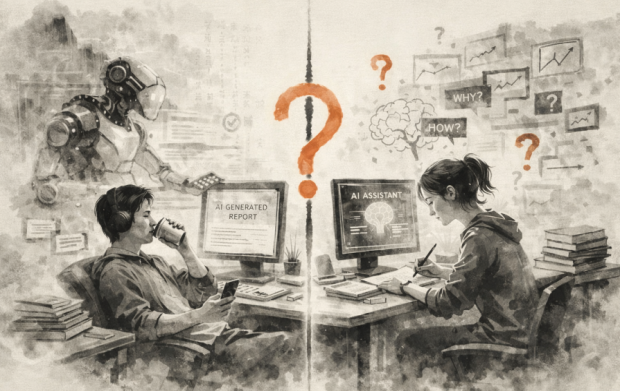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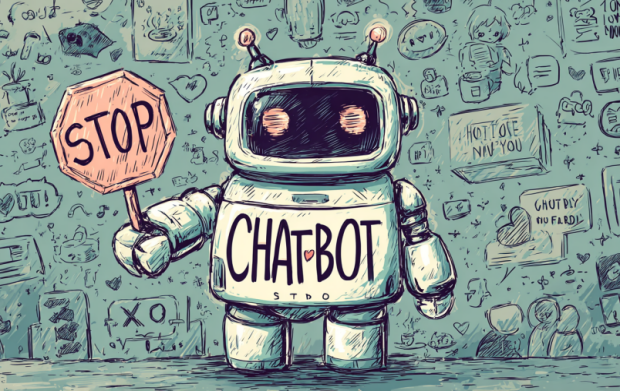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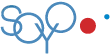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