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합편성 채널에 AI 앵커가 등장했다. 이름난 이 채널의 여성 앵커와 똑 같은 얼굴, 똑 같은 목소리, 똑 같은 제스처를 익히고 배운 AI 앵커가 인터넷 정오 종합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는 것처럼 AI 앵커의 출현은 저널리즘도 이 대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른 분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저널리즘에 관여하는 AI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저널리즘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과 비용 절감이나 수용자 확대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이다. AI 앵커는 한 사람의 존재를 동시다발로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이 낳은 결과물이다. 인간 앵커를 굳이 TV 스튜디오로 불러낼 필요가 없다. 분장이나 의상 같은 보조 업무도 필요 없게 만든다.
 MBN 홈페이지 캡처
MBN 홈페이지 캡처
뉴스는 신뢰성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그 신뢰성은 뉴스 전달자의 대중성이나 인기에 영향을 받기마련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대신한 AI 앵커의 기용은 뉴스의 공급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고만 입력하면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이 실제와 전혀 다름없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는 있다. 똑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AI 앵커가 인간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기는 어렵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틀에 박힌 정확성이나 신속성보다 진솔성과 더불어 당사자나 수용자를 배려한 감정이입의 전달력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AI도 감정을 배운다고 하지만 인간 고유의 그 속성을 완벽히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AI 기자, AI 아나운서 등이 잇따라 등장한다 해도 아직은 제한적이고 실무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인물을 대신한 AI가 아니더라도 기사의 취재와 제작 및 전달 방식에 인공지능은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해 기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이제는 관행이 되었다. 로이터는 ‘뉴스 트레이서’(News Tracer)라는 AI 도구를 이용해 트위터에서 뉴스를 발굴하고, 뉴스 가치에 따른 순위를 매긴다. ‘링스 인사이트’(Lynx Insight)라는 AI 도구는 방대한 재무 자료 속에서 특정한 트렌드를 찾아내 기자에게 알려주고, 심지어 기사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AI 로봇 기자는 2014년 LA타임즈의 지진 속보로 처음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 SBS가 AI 로봇 기자를 활용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 기사에 AI가 투입되었다. 2020년에는 연합뉴스가 머신러닝 기반의 날씨 뉴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뉴스 전파의 핵심 통로인 포털의 뉴스 편집도 AI가 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검증과 뉴스에 붙는 댓글의 필터링까지 AI가 담당한다.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저널리즘에서 AI의 역할과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명암이 뒤따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MSN과 엣지(Edgy) 브라우저, 앱에 제공하는 뉴스의 선별 작업에 AI 투입을 확대하면서 수십명의 저널리스트를 해고했다. AI 편집 기자가 인간 기자보다 업무 처리 역량이 뛰어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AI는 시대적 흐름이고, 당위적 흐름이다. 새로운 형태의 기사 발굴이나 심층적 취재를 가능하게 만들고, 빠른 기사 작성과 신속한 전파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막아내는 데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다. 하지만 데이터가 오염되고 알고리즘에 편향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상시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치 판단과 공감 능력 면에서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론은 AI가 저널리즘을 키울 수 있지만 만능이 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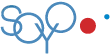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