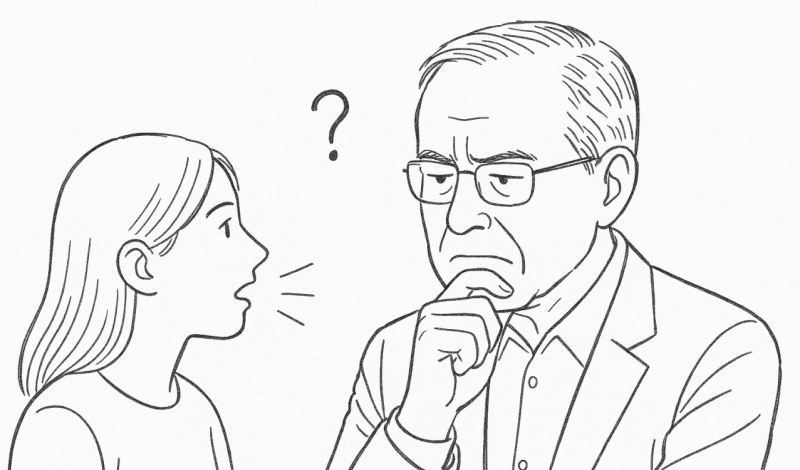
“나이가 들면 언어 습관도 굳어진다”는 통념이 과학적으로 뒤집혔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의회 연설 790만 개를 AI로 분석한 결과, 노년층도 젊은 세대 못지않게 빠르게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1873년부터 2010년까지 약 140년에 걸친 미국 의회 연설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진은 “monitor”, “articles”, “satellite”, “outstanding” 같은 단어들이 시간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화자의 나이에 따라 새로운 의미의 채택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했다. 예를 들어 “articles”는 물리적 상품, 법률 조항, 또는 기사라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고급 언어 모델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해 각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놀라운 것은 결과였다. 나이든 화자들이 새로운 의미를 채택하는 속도는 젊은 화자보다 평균 2~3년 정도 늦을 뿐이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부 단어의 경우 오히려 노년층이 변화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냉전 시대에 지정학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satellite”의 경우, 나이든 의원들이 먼저 이 새로운 용법을 사용했다.
이 발견은 사회언어학의 오랜 가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동안 많은 언어학자들은 “겉보기 시간(apparent time)” 방법론을 사용해왔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언어 사용을 비교하여 언어 변화를 추론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성인의 언어 사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그 전제가 적어도 단어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를 주도한 가우라브 카마스는 “나이든 사람들도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인다”며 “당신의 부모나 조부모도 ‘sick’을 ‘멋지다’는 의미로, ‘model’을 ‘AI 모델’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흥미를 넘어, 우리가 세대 간 소통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재고하게 만든다.
연구진은 이를 “시대정신(zeitgeist)” 효과라고 명명했다. 단어 의미의 변화는 세대 간 교체를 통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시대적 순간의 산물로서 모든 연령대의 화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집단적 변화라는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수십 년에 걸쳐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단어 사용 방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으며, 이는 전체적인 사용 패턴의 변화와 밀접하게 일치했다.
이번 연구의 방법론 자체도 주목할 만하다. 790만 개라는 방대한 연설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은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이는 전통적인 소규모 관찰 연구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결론을 가능하게 했다. 카마스는 “이 연구가 NLP 도구를 인간 언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더 많은 언어학적 탐구에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한계도 있다. 이 연구는 최소 25세 이상의 성인 화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언어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언어 사용을 포착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 의회 의원이라는 특정 사회정치적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과 소수자가 과소 대표되어 있고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나이가 언어적 유연성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생애 전반에 걸쳐 언어를 통해 시대와 호흡하며 변화한다는 것이다.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대에, 이 연구는 나이와 적응력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과학적으로 반박한다. 언어는 세대를 가르는 장벽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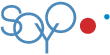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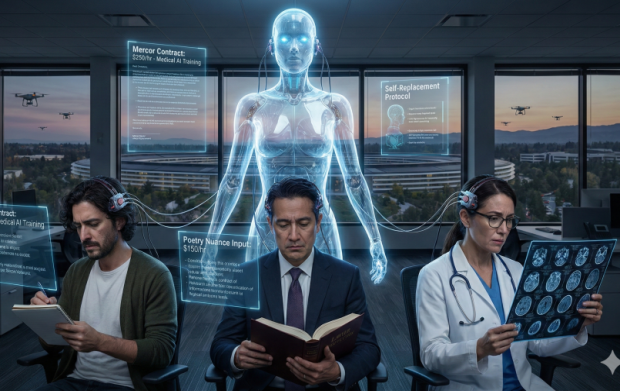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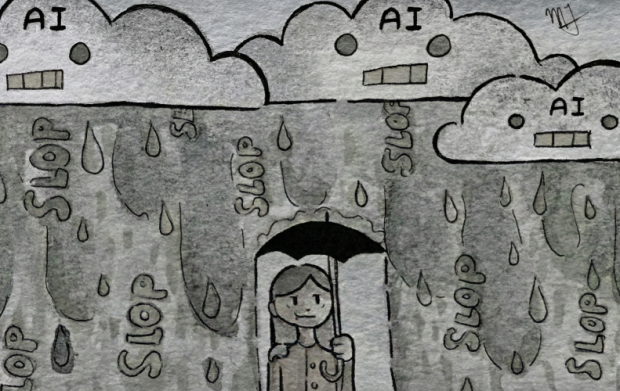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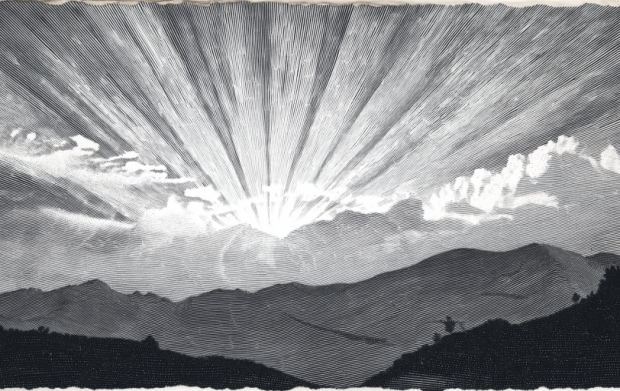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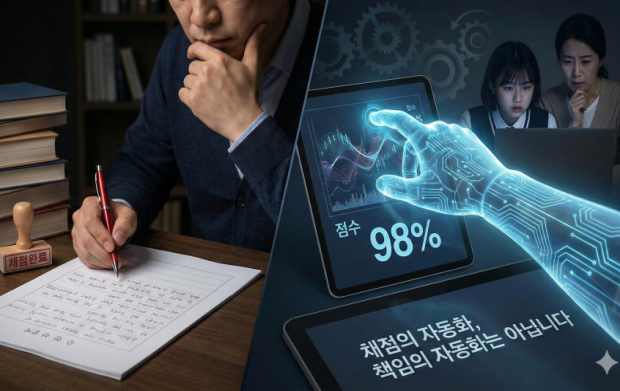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