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몸이 소멸해가는 걸 막고 싶어
네가 마주할 낯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싶어
박영 <위안의 서>중에서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살인의 추억(Memories of Murder , 2003)에서는 개성이 서로다른 두 명의 형사가 나온다. 한 형사(송강호)은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믿고 또 다른 형사(김상중)는 증거(evidence)를 신봉한다. 촉(燭)으로 범인을 쫓는 형사와 “증거는 배반하지 않는다.” 의 신념을 근거로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 영화는 감각수사 VS 과학적 수사 라는 두 개의 코드를 내세우며 범인을 추적하지만 끝내 (모호하게)잡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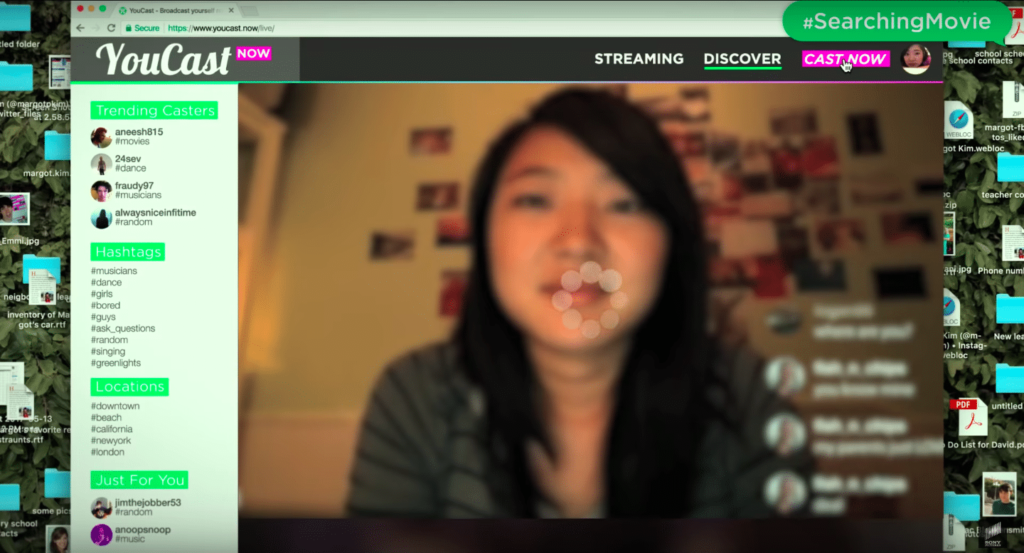
그로부터 15년 후, 감각과 과학수사를 뛰어넘는 디지털 추적 영화가 나왔다. <서치>(원제: Searching 2018)다. 영화를 보고있으면 각종 디지털을 활용하는 주인공의 손과 감각 그리고 현란한 화면에 눈을 뗄 수가 없다. 줄거리는 이렇다. 목요일 밤 11:30 PM – 딸의 부재중전화 3통 – 딸의 실종 – 아빠(데이빗 킴)가 딸을 찾아나선다는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흥미로운 지점은 스릴러의 매력을 충분히 살린 반전의 스토리에 있지 않다. 그 정도의 반전과 스토리 구조는 다른 영화에서도 이미 충분히 보아왔다. 영화의 포인트는 범인을 잡는 추적과정에 있다. 최첨단의 디지털로 딸의 흔적(시간/공간/관계)을 추적하고 잡아내는 전개라인이 퍽이나 흥미롭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납치와 살인, 충격과 반전이 미스터리 스릴러의 중요한 흥행기법인데 이 영황에서는 칼과 총, 살인과 피의 향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미간을 찌뿌리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억! 하며 보는 스릴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MS Window XP, 최신 애플 아이폰, 맥북, 인터넷, 모바일, 구글, 지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SNS), 모바일메신저와 1인 방송, 유페이스, 페이스타임, 유캐스트, 웹캠, 스냅쳇, 인스타그램, CCTV 등을 화려하게 등장시킨다.
실종된 딸의 아빠(데이빗 킴)는 이 디지털 기기들을 능숙하다 못해 현란하게 다룬다. 매 장면마다 저건뭐지? 어, 저건 또 뭐야? 음 저건 나도 아는건데? 하며 실종된 딸의 위치를 같이 추적하게 만든다. 결국 아빠는 딸의 디지털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범인을 잡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딸에게 “Mom would be too”라는 메신저를 보내면서 영화는 끝난다. 딸의 탄생과 성장과정 엄마의 죽음으로 시작한 영화는 의미있는 메신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며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즉 당신들은 가족간에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딸(마고 킴)의 실종은 SNS로부터 유발되었다. 딸은 엄마(파엘라 킴)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버틸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빠는 그런 딸이 피아노에 빠져있을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딸은 텀블러(SNS)에 빠져 있었고 마리화나도 피우고 있었다. 엄마의 부재를 달래줄 무언가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아빠는 사랑스런 딸이 피아노에 매진하고 있는 줄 알고 방심했지만 사실 딸은 낯선 세상과 접속하고 있었다. 취향과 목적이 일치하면 언제든 접속하고 소통할 수 있는 SNS, 그것은 나를 최대한 노출시킬 수 도 있지만 한편 훔쳐보는 누군가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투명하게 자신을 노출하지만 누군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대상을 엿 볼 수 있다. 딸은 접속하던 SNS로 인해 실종됐지만 결국은 SNS로 범인을 잡는다.
영화는 호평속에서 흥행의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흥행은 여러 요소가 작용할 터이지만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건 아마도 나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나와 가족, 나와 디지털, 나와 타인 그리고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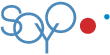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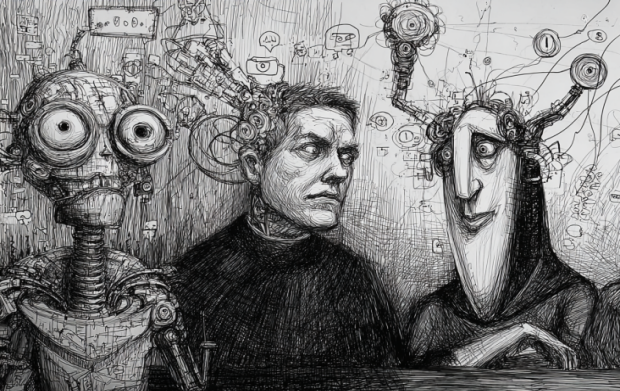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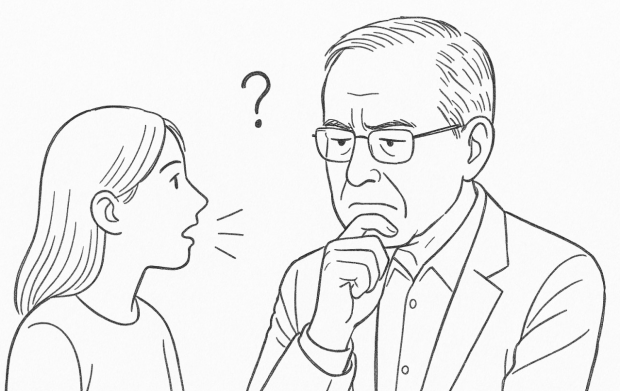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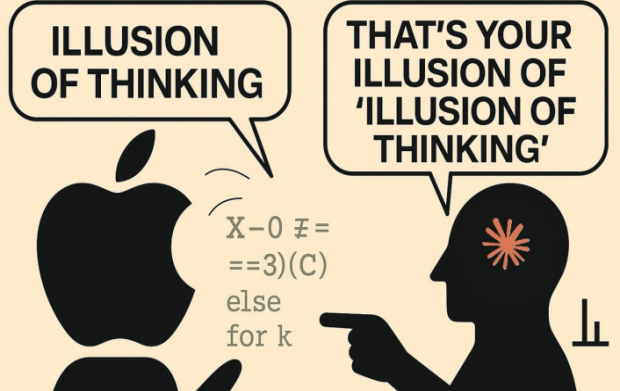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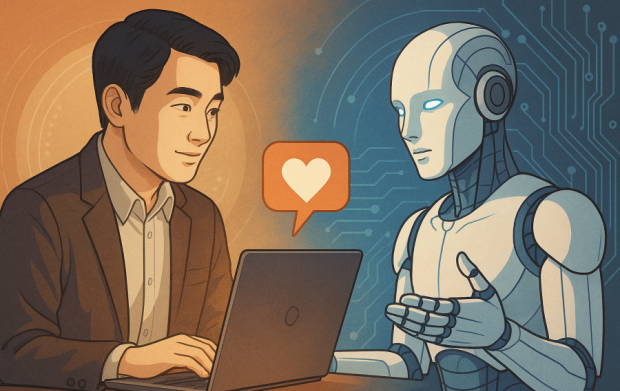
![[번역] 교육의 목적을 재고해야 합니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5/05/22115336/0_%E1%84%8C%E1%85%A1%E1%84%82%E1%85%B3%E1%86%AB-%E1%84%8B%E1%85%A1%E1%84%8B%E1%85%B5%E1%84%83%E1%85%B3%E1%86%AF_62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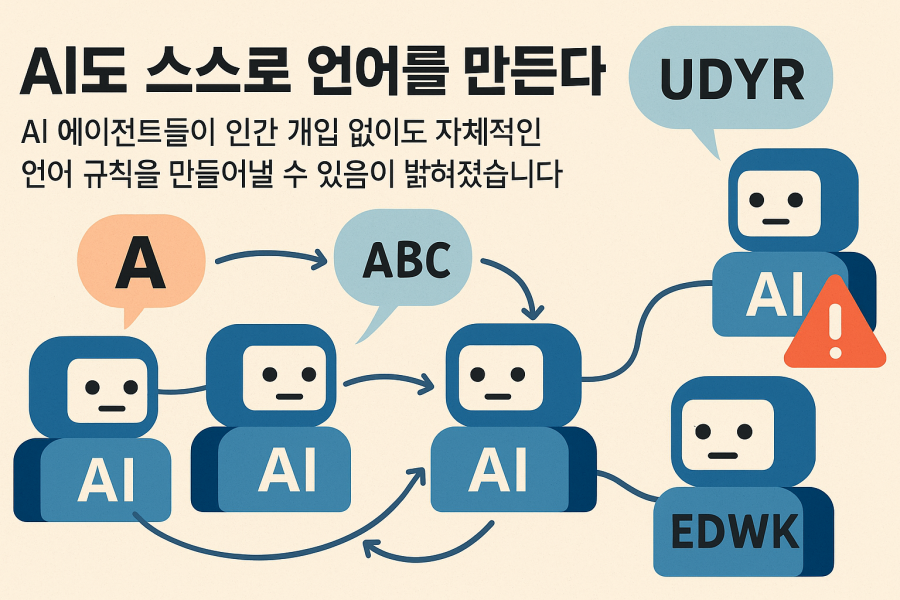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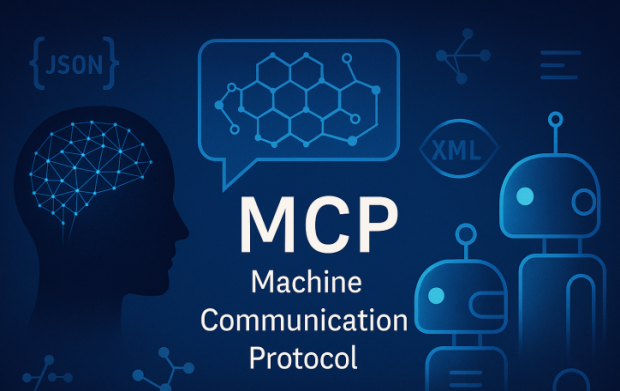
![[번역] 살 칸과 빌 게이츠는 AI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5/04/15164712/0_%E1%84%86%E1%85%B5%E1%84%85%E1%85%A2%E1%84%92%E1%85%A1%E1%86%A8%E1%84%80%E1%85%AD_62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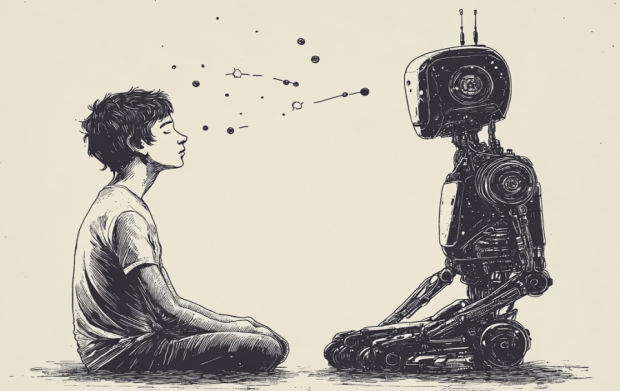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