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교사를 대신해 수업을 짜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제를 입력하면 학습 목표부터 활동, 평가 방식까지 순식간에 등장합니다. 수업 준비에 쫓기던 교사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도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르스 테크니카Ars Technica는 최근 기사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Teachers get an F on AI-generated lesson plans.” 교사들이 AI에게 ‘F’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0%가 이미 AI를 수업 준비나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AI를 쓴다는 교사들은 주당 평균 5.9시간, 즉 학기 전체로 따지면 6주 분량의 시간을 절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놀라운 효율이죠. 그러나 그들이 AI의 수업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은 아끼지만, 내용은 비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연구자들이 AI에게 시민 교육(Civics) 과목의 수업안을 300개 생성시켜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이 ‘암기형 활동’ 중심, 즉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거나 토론할 기회가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는 시도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보다는, 정답을 찾는 훈련에 그친 셈입니다.
“AI의 수업안은 마치 완성된 퍼즐 같지만, 정작 중요한 조각은 빠져 있다.” 한 교사의 표현은 이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교사들은 또한 “AI가 만든 수업안은 현실의 교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반응, 학급 분위기, 지역적 특성, 심지어 계절감 같은 요소들은 데이터로 표현되기 어렵습니다. 교실은 알고리즘이 아닌 공기와 관계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AI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막힐 때 아이디어를 던져주거나, 복잡한 자료를 정리해주는 데는 유용합니다. 교사에게 ‘시간의 여유’를 선물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는 반가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절약한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수업의 핵심인 ‘생각을 설계하는 일’, 그건 여전히 교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수업을 그대로 쓰면 편하지만, 학생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수정하고, 다시 짜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교사는 이제 ‘AI가 짜준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빠뜨린 맥락을 다시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교사들이 AI에게 낙제점을 준 건,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교육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수업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의 눈빛을 읽고, 질문을 바꾸고, 함께 생각의 길을 찾는 일 말입니다.
AI는 교사의 시간을 대신해줄 수는 있지만, 생각의 깊이는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AI가 수업의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사는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기계가 만든 계획에 인간의 마음을 다시 불어넣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의 마지막 인간적 예술일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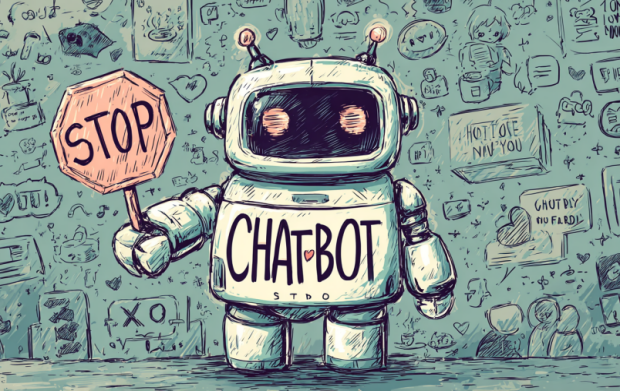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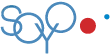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