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리 사이 꽃양귀비
J 선생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4년 만이었다.
4년 전, 선생님은 밝고 환한
목소리로 전화하셨다.
어찌나 그 목소리가 좋았는지 나는 한동안 그 기운에 묻어 살았다.
오늘 선생님과 문자를 주고받다 아무래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지 않은 선생님은 두 시간쯤 지난 후 전화를 걸어와 전화했네, 하셨다.
선생님은 먼저 시집 <전화번호를 세탁소에 맡기다>와 산문집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를 한꺼번에 낸 것에 대단하다며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용인이란 곳에 시골이 있느냐, 책방 하면서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등등 나의 안부를 먼저 물으셨다.
그런데 왠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안 좋았다. 사실 문자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다. 선생님은 말했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 지금 하는 일은 정리하는 일이에요. 책을 내는 일도 새로 쓰는 게 아닌 정리하는 일이에요. 새 책이 나오면 새로운 걸 쓴 것이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서 낸 것이구나 그리 아시면 돼요. 무엇을 계획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만난 게 내가 40대지요? 그때는, 생각하면 참 젊었어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70대가 되니 다른 사람들 만큼 병도 오고. 그래도 돌아갈 수 없으니 어쩌겠어요. 벌여놓은 걸 정리하고 가야지요. 임후남 씨도 더 이상 젊지 않지요?
아, 내가 아는 선생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다.
선생님 앞에서 100세 인생 같은 말을 할 처지가 나는 못 되었으므로
네, 네, 그래도 선생님, 네, 이런 말만 하다 전화를 끊었다.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로 기운을 차렸던 때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선생님과 통화를 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선생님의 목소리가 내내 맴돈다. 아침나절, 마당의 풀을 뽑고 화단을 정리하면서도 선생님을 생각했다. 위중한 병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말대로 노화와 함께 이런저런 병이 왔을 것이고, 코로나 시국에 외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 만날 일도 소원했을 것이고, 그러다 울적한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지난해 떠난 시인 최정례 선생과 소설가 박기동 선생님도 생각났다. 최정례 선생과는 병석에 있을 때도 때때로 문자와 통화를 했었던 터라 그 황망함이 더 컸었는데.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무슨 말이든 서슴없이 한다. 운동을 하라, 몸에 좋은 걸 먹어라, 열심히 살아라 등등에 이어 재테크를 하라까지. 건강할 때는 그래서 서슴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흉내 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에 쭈뼛거리게 된다. 쭈뼛거리기는커녕 흉내도 내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한 이들이 서슴없이 하는 말은 때때로 상처가 된다. 조언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체 그걸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요즘 같은 정보가 널린 시대에.
내가 선생님의 나이가 안 되었으므로, 내가 선생님 처지가 안되었으므로. 그러니 나는 선생님의 말을 그저 네, 네, 하면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같은 나이라고 해서, 살아봤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아파봤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저 오늘의 나를 살아갈 뿐이다.
[출처] 오늘을 살아갈 뿐|작성자 생각을담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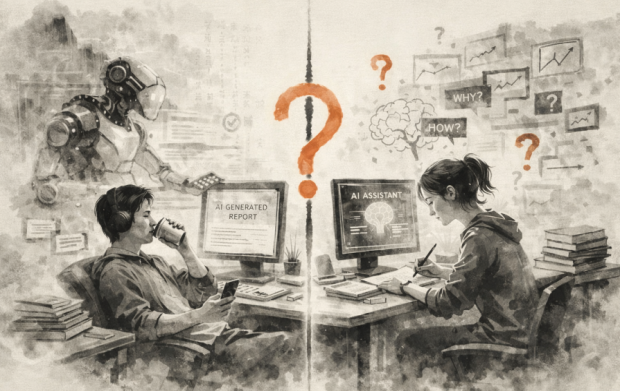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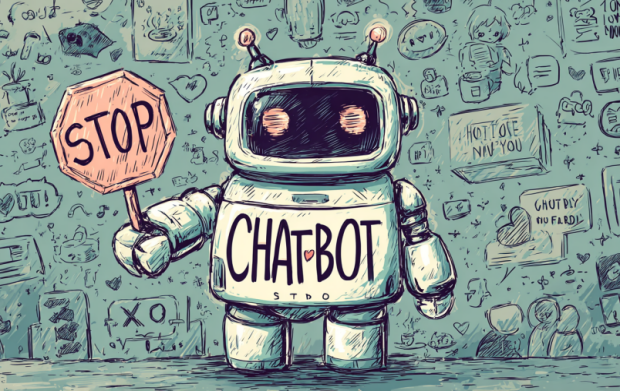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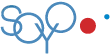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릴때부터 지금껏 변화 속에 살았는데도, 나이 들고 맞이하는 변화는 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4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새삼스럽게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을 의심하게도 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포자기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허망하게 날아간 하루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가 더 보태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인생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글에서 40대를 젊었다. 참 좋았다… 하는데 내 인생 40대니 참 좋은 시절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다 다르니 그러니 아는것이 없는 것이고 그저 오늘을 살아간다는…
감사합니다. 또 지혜를 얻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