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책방입니다>를 갖고 북토크를 하던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시간이 없고 다른 볼거리도 많고 한데 오래 책을 읽은 이유는 무엇인가.
책을 오래도록 읽었다는 말을 한 끝에 나온 질문이었다. 그런데 책을 ‘오래’ 읽었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 싶었다. 책을 놓지는 않고 나이를 먹었으니 오래 읽은 것은 맞지만, 책을 ‘많이’ 읽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서가도 아니고, 다독가도 아닌데. 그러다 그의 질문에 답하다 문득 튀어나온 말이 ‘지적 허영’이라는 말이었다. 한번도 생각하지 않은 말이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지적 허영에서 비롯된 걸까, 말을 하면서도 생각했다.
책 읽기는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도피처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나의 독서는 주로 소설책과 시집이었으므로 그 속으로 들어가 ‘읽는’ 동안은 즐거웠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생활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읽는 책이 아닌, 좋은 책을 찾아 읽으려고 했다. 책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읽고 싶어지는 책 목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다른 책으로 저절로 옮겨간다. 좋은 소설을 한 편 읽으면 그 작가 것을 찾아 읽거나 그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작가 책을 읽어가는 식. 신문이나 잡지에서 좋은 서평을 보면 그것을 찾아 읽고, 읽은 책 속에서 책이 나오면 찾아 읽고 그런 식이다. 물론 ‘일’을 위해 책을 읽는 것은 제외하고.
‘지적 허영’이란 말을 하고 보니 또 튀어나온 말이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말이었다. 이건 또 무슨! 그런데 또 말이 이어졌다(생각하고 말해야 하는데,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ㅜ)
젊은 시절, 생활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는 문학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문학을 하지 않고 잡문을 쓰는 나를 스스로 낮추기도 했다. 문학을 하는 친구들 곁에서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일종의 문학병을 앓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 사람들과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과도 섞이지 않는, 스스로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내가 찾아 읽었던 것은 역시 소설과 시였고, 철학, 사회과학 등 인문학 등으로 그 범위가 조금 넓혀졌다. 내가 이인성의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버리지 않는>이나, 미셀 푸코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아서 니호프의 <사람의 역사>를 읽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들의 말과 눈빛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다. 난 너희와 달라. 내가 언제까지 잡문만 쓸 건 아니야. …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저 책들은 다 어느 한 시절이다. 다른 시절은 다 생각나지 않고 왜 그 시절만 생각날까. 조금 이상한 일이다. 나는 그 시절, 나는 모 신문사 출판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매일 글을 써댈 때와 달리 그때는 출판기획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책을 ‘잠깐’ 보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책은 회사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책을 읽었을까?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늘 책을 본다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고 보니 공백이 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더 이상 문예지도 보고 있지 않았고, 한국 작가 소설을 읽지 않고 있었다. 지금도 내가 아는 젊은 작가는 그리 많지 않다.)
따지고 보면 지적 허영이 아닌, 지적 허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지적 허영은 그 책을 구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고, 지적 허기는 그 책을 읽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니다. 김현 선생님이 번역한 책이고, 르네 마그리트의 같은 제목의 그림이 표지로 올라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입했던 기억이 날 뿐, 내용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책을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나의 그릇만큼 받아들일 뿐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책을 읽을수록 마음이 풍족해진다는 것이다. 좋은 전시회에서 느끼는 풍족함, 좋은 음악회에서 느끼는 풍족함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좋다고 하니 좋은 것이 아닌, ‘내가 느껴야’ 좋은 것이다. ‘나’는 저마다 다른 ‘나’이므로 좋은 지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 읽고 싶은 대로 잡다하게 틈틈이 읽을 뿐이다. 시골에 책방이랍시고 차려놓고 매일 새로운 책을 바라보는 지적 허영을 부리면서, 짬짬이 그 책들 중 하나를 골라 읽고 지적 허기를 때우면서 말이다. 어쩌면 책방을 하는 것도 나의 이런 허영심과 허기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겠다.
[출처] 지적 허영과 지적 허기|작성자 생각을담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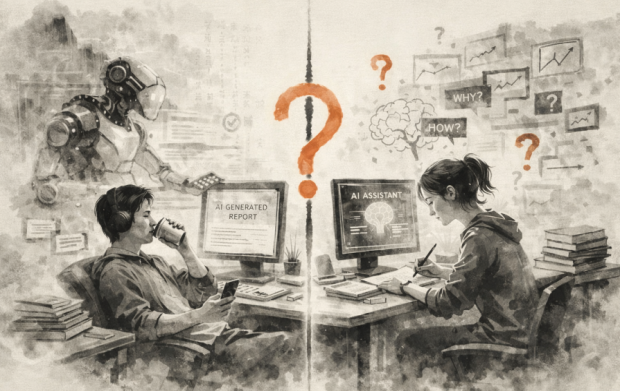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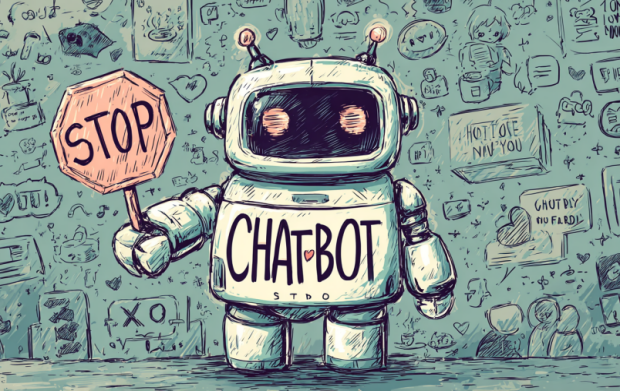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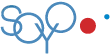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